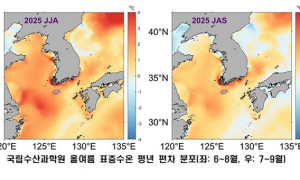이여싸나 이어도사나 이여도사나 (이어도사나)
요 넬 젓엉 / 어딜 가리 (이 노를 저어서 어디를 가리)
진도바당 / 한골로 가세 (진도바다 큰 물로 가세)
한착 손엔 / 테왁 심고 (한 쪽 손에 테왁을 들고)
한착 손엔 / 빗창 심어 (한 쪽 손엔 갈고리 들어)
한 질 두 질 / 들어간 보난 (한 길 두 길 들어가보니)
저도가 / 분명허다 (저승이 따로 없네)
이여도사나 / 쳐라 쳐라 (이어도사나 /저어라 저어라)
한 목 지엉 / 어서나 가자 (한 목 잡으러 어서나 가자)
제주도 해녀들이 물질을 하거나 노를 저으면서 불렀던 노동요이자 구전 민요인「이어도사나」의 한 대목이다. 어렵고 힘든 물질을 하던 해녀들의 고단한 삶이 고스란히 녹아든 이 노랫가락이 70년 만에 독도 바다에 다시 울려 퍼졌다.

지난 18일 제주 해녀 34명이 광복 77주년을 맞아 독도를 방문했다. 70여 년 전 열악한 환경에서도 강인하게 일하면서 독도를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한 제주 해녀의 독도 개척사를 살펴보고, 관련 내용을 수집, 정리해서 독도 영토주권 강화를 위해 활용하고자 경북도가 기획한 행사의 일환이다. 이 중에는 1950~60년대 독도에서 실제 물질을 했던 김공자씨 등 해녀 4명도 포함돼 그 의미를 더했다.
제주 해녀박물관 등의 자료에 따르면, 제주 해녀의 독도 조업은 일제 강점 말기인 1940년대부터 시작됐고, 광복 이후 한국인 선주들에 의한 미역 채취 작업이 본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확인된다. 처음 10명 이내였던 제주 해녀의 독도 조업은 1950년대 후반에는 20~40명으로 규모도 확대된다.

초기에는 주로 제주 한림지역 해녀들이 독도 물질을 갔는데, 그 증거로 한림읍 협재리 마을회관에 1956년 건립된 ‘울릉도 출어부인 기념비’가 남아 있다. 비석 옆면 비문에는 ‘객고풍상/성심성의/애향연금/영새불망’(客苦風霜/誠心誠意/愛鄕捐金/永世不忘, 객지에 나가 고생하면서도 고향을 사랑하여 돈을 내놓았으니 성실한 마음과 성실한 뜻을 영원토록 잊지 않으리)이라고 새겨져있고, 뒷면에는 독도로 출가물질을 다녀온 23명의 해녀 이름이 빼곡히 적혀있다.

제주 해녀들이 본격적으로 독도에 건너가게 된 계기는 독도의용수비대의 해녀 모집이었다. 일본이 광복 후 수시로 순시선을 보내 독도에 대한 검은 속내를 드러내고, 1953년 한국전쟁을 틈타 독도에 ‘일본 땅’이라는 푯대와 어업 금지 팻말을 세우는 등 독도를 수시로 불법 침탈하자 울릉도 청년 홍순칠은 독도의용수비대를 조직했다. 그리고 독도 사수를 위한 자체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미역 채취를 시작했고, 이에 제주 해녀들을 모집한 것이다.
당시 해녀들은 독도 서도에 지하수가 샘솟는 큰 동굴인 몰골에서 생활했다. 가마니를 이용해 임시 숙소로 삼고, 지하수로 식수를 얻으며 한 번에 수십 명이 들어가 2~3개월씩 거주하면서 미역을 채취하고 널어 말렸다.

제주 해녀들의 독도에서의 어업 활동에 관한 연구 자료에 따르면, 이들은 당시 비록 생계를 위해 수비대에 고용된 노동자였지만 일본의 침탈 야욕에 맞서 독도에 상주하는 독도의용수비대와 함께 독도 지킴이에 큰 일조를 했다. 해녀들은 독도 동도 정상에 막사를 설치하고 독도 사수에 들어간 수비대가 먹을 물이 떨어져 곤경에 처했을 때, 서도 몰골에서 물을 실어 동도에 살던 대원들에게 전달했다. 또 높은 파도로 울릉도 보급선이 독도에 접안할 수 없어 대원들이 아사 직전의 위기에 놓였을 때도 해녀들이 풍랑 속에 뛰어들어 식량을 조달했다. 독도의용수비대가 3년 이상 독도에 주둔하게 된 것도 제주 해녀들의 숨은 노력과 공로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평가다.

이처럼 독도 바다의 거센 풍랑의 헤치며 생업을 이어가면서 독도를 지켜낸 제주 해녀들은 독도의 실효적 지배에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우리 땅 독도의 산증인이다. 그 강인한 정신이 70년이 지난 오늘 독도에 다시 살아 숨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