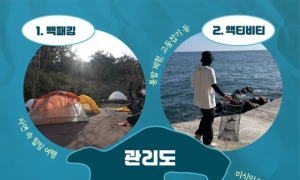
다음 날에도, 할머니는 품속에 보따리를 안고 거실로 나왔다. 눈을 동그랗게 뜬 엄마의 눈과 내 눈이 마주쳤다. 엄마가 몸을 내 앞으로 기울이며 어깨를 으쓱 들었다. 영문을 모를 때 하는 몸짓이다.
‘저 속에 무엇이 들어있을까?’
엄마를 따라 나도 어깨를 으쓱했다. 궁금했다. 말없이 앉아 있는 할머니를 흘낏 곁눈으로 보았다.
“어머니 그렇게 앉아 계시지만 말고 저랑 목욕탕에 갈까요. 네?”
나는 기회는 이때다 싶었다. 보따리를 풀어볼 계획이었다. 그런데 이게 뭐야?
할머니는 그 작은 보따리를 접의자처럼 옆구리에 끼고 목욕탕으로 향했다. 그렇다면 작전 개시를 시작할 수밖에. 나는 계획에 없는 목욕탕 행을 결심했다.
“엄마, 나도 목욕탕 가야겠어. 요즘 몸이 근질거려서…….”
나는 일부러 몸을 긁기 시작했다.
“아니, 얘가 아까는 질색을 하더니.”
할머니의 팔짱을 끼고 나는 목욕탕에 도착했다.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곳에 자리를 잡았다.
“할머니 제가 등 밀어 드릴게요.”
“그럴래?”
할머니가 내게 등을 내밀었다. 나는 수건으로 할머니의 등을 밀었다. 앙상한 뼈다귀에 수건이 걸려 밀어지지 않았다.
“아이구, 시원하네.”
“할머니, 궁금한 것이 있는데 보따리 속에 무엇이 들어 있어?”
“보따리?”

할머니는 탈의실 사물함에 두고 온 보따리가 걱정되는지 탕 밖을 자꾸 내다보았다. 마치 보따리를 누가 가져가기라도 할 듯이. 그러다가 누런 이를 내보이시며 씩 웃었다.
나도 따라 어색하게 웃었다. 도통 알 수가 없다.
“할머니 그 보따리 한 번만 보여줘!”
“안돼! 할머니 보물이여.”
“보물?”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게 할머니는 돌아앉았다.
엄마가 그만 하라는 표정으로 내 옆구리를 쿡 찔렀다.
목욕이 끝나고도 할머니는 보따리를 먼저 챙겼다.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