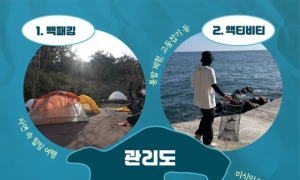
코로나가 언제쯤 끝날까? 마음껏 사람을 만나고 먹거리를 찾아 나설 수 없는 이즈음이기에 굴구이의 추억은 더욱 그립고 강렬하다.
그날, 평소 가까이 지내던 사람들과 바람이나 쐬자며 충남 보령시 천북면에 있는 ‘굴구이집’을 찾았다.
정월 대보름을 갓 넘긴 날씨는 바람을 데불고 와서 춥기도 했지만 우리 나들이는 마냥 즐겁고 신이 났다. 서산을 출발해 홍성군 남당리의 모산만을 건너 연결한 하구댐을 건너자 이내 굴구이마을에 닿는다.

작은 포구 앞에 무려 90여 군데의 굴전문구이집 아낙네들이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다. 주말이나 일요일이면 인근지역뿐만 아니라 수도권 지역에서도 사람들이 찾아와 성시를 이룬다 한다. 다행이 우리가 찾아간 날은 평일이라 조용하고 느긋하게 굴구이의 맛을 즐길 수가 있었다.
시원시원하고 걸쭉한 주인아주머니로부터 푸짐한 굴바구니와 도구를 건네받았다. 벌겋게 타오른 번개탄 위에 굴을 올려놓고, 왼손엔 목장갑, 오른손엔 과도를 든 채 불 위에서 익어가는 굴을 바라보았다. 절로 흘러나오는 침을 삼키며 서로를 바라보다가 그만 한바탕 웃음을 터트리고 말았다.
탁탁 튀는 소리와 함께 꽉 다물고 좀처럼 입을 벌리지 않을 것 같던 굴이 더 이상 뜨거워 견딜 수 없었는지 살짝 입을 벌리기 시작했다. 그 때 굴껍질을 과도로 마지막 벌려 굴을 꺼내 먹으면 되는 것이다. 평소 비릿한 냄새가 싫어 생굴은 별로 좋아하지 않았었는데, 짭짜름하고 통통하게 살진 석굴구이 맛은 먹을수록 향긋했다.
한동안 굴구이 맛에 취하다가 석쇠 바닥이 보일쯤 해서 한 잔의 술을 생각해냈다. 그런 자리에 소주 한 잔이 없어서야 되겠는가? 앉은뱅이 의자에 마주 앉아 뽀얀 연기 속에서 오고가는 소주잔속에 서로의 정까지 듬뿍 넣어 마시니 무릉도원이 따로 없었다.

갯벌에서 피어난 천북굴은 덩어리 형태가 다양하게 많고, 크기가 작은 여러 굴 개체가 따개비 등과 함께 붙어 있어 촌스럽기 이를 데 없다. 그런 모습이 어쩌면 촌 아낙네와 조화를 이루면서 투박스럽기 그지없다. 그러나 딱딱한 굴 껍질을 까면 토실하면서도 노르스름한 회색빛을 띤 속살이 드러나는데, 그 짭조름하고 쫄깃거리는 맛이 그만이다.
굴은 비타민이 풍부하고 소화흡수력이 높아 바다의 우유라 부른다. 특히 천북 굴은 천수만 일원에 서해로 향하는 지천이 많아 해수와 담수가 골고루 섞인 뻘 속에서 서식한다. 미네랄이 풍부할 뿐 아니라 일조량이 많아 맛이 최고일 수밖에 없다 한다. 12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가 그 맛의 절정기라 한다.
석쇠에 통째로 올려 굽는 굴구이는 예전에 뱃사람들이 허기를 달래기 위해 배위 화로에서 구워먹던 것이 유래가 됐다 한다. 그들의 배고픔이 오늘날 우리에게 낭만으로 느껴지는 건 그만큼 살림이 여유로워졌다는 걸 반증이라도 하는 것일까? 바다에서 막 건져 올려 불에 구워진 싱싱한 굴맛을 보며 살았을 그들이 부럽기도 했다.
충청도 사투리가 구수한 아주머니의 다음에 또 오라는 인사를 뒤로 하고 우리는 밖으로 나왔다. 멀리 수평선 너머로부터 불어온 짠 바람이 취기를 깨웠다. 그리고 그림처럼 자그마한 포구의 회색빛 하늘 아래에는 몇 척의 목선이 한가로이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술기운도 아닌데 그만 그 모습에 다시 취하고 말았다.
좋은 사람들과 오붓하게 앉아 웃음꽃을 피우며 소주잔을 돌려가며 먹는 석굴의 쫀득한 맛은 일상생활에 찌든 우리에게 자연이 주는 특별한 선물이 아닐 수 없다. 무엇보다 도회지에서 자라, 바다와 농촌모습을 접할 기회가 없었던 이런 즐거움은 분명 축복이었다. 따뜻한 심장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에 따라 갯벌에서 피어난 석화의 참맛은 언제나 나에게 행복을 안겨주기에 충분했다. 다가온 굴 구이 철에는 마음껏 훌쩍, 떠나 그 때 그 사람들과 함께 추억의 굴 구이를 맛볼 수 있기를 고대해본다.























